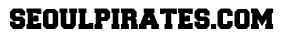문학 Amor Fati (1)
페이지 정보

본문
Amor Fati(1).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듯,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고 돌아올 추위였지만 눈 앞에 흐드러진 매화를 흩날릴 때 쯤이었나. 아님 그 전이었나.
은근하게 식어버린 100원짜리 국밥집 자판기 커피를 한 손에,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의 한 구절로 인한 말보로를 한 손에 들고. 그때인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가 생각난 것은. 날씨 때문이었다. 그래 그 날씨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른이 된 기쁨도 잠시 2년간 함께한 여자친구와 그리 좋지못한 끝을 본 나는 어른이랍시고 다음 날의 일정도 잊어버린 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땅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가는 길 수십번도 무릎을 꿇었다. 오늘 안주가 무엇이었는지 기어코 확인하고서야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도착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은 손바닥에 생긴 작은 생채기였다. 그보다 더 울렁이는 속을 달래려 냉장고를 열고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나 되는 물을 마신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아직도 빙빙 도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새겨진 격자 무늬를 하나하나 세어가다 그 점이 대충 3사분면에 (난 이과였다.) 도달했을 쯤,
'오늘이 무슨 날이었더라..'
3초 정도 뒤에, 빙빙 돌던 천장이 멈추자 늦었다는 것을 직감한 나는 미친 듯이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만질..시간은 없었기에 대충 물기만 말리고 그 날씨에 어울리지도 않는 페라리 라이트를 반 통은 부어대고 집을 나섰다. 집부터 학교까지는 한 시간 거리. 서두르더라도 대학생으로써의 첫 인상은 '지각생'으로밖에 낙인 찍힐 수 없는 나를 한탄하며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했을 때 생각했다.
'핸드폰은?'
다행히 어제 입었던 옷을 대충 걸치고 나왔던 터라 주머니 안에 지갑과 함께 고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세 정거장 쯤 지나서 알았다. 핸드폰은 이미 수명을 다해 아무리 눌러도 어떤 화면도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씨X...'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내가 내려야 할 역은 어딘지 분명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늦었다는 불안감에 1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00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쌀쌀한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지나 바닥에 붙어있는 학과 OT 안내를 따라 크게 심호흡을 하고 강의실의 문을 열었다, 열었는데,
'...?'
너무나도 적막하고 불이 꺼진 강의실을 둘러보며 이미 모든 OT가 끝나고 벌써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분명 문앞에 테이프로 약간 삐뚫어지게 붙어있는 종이엔 '컴퓨터공학과 신입생 OT'라는 글씨가 검은 매직으로 굵직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는? 날짜를 틀렸을 리가 없다. 어제 술 마시러 나갈 때만 해도 다음날 OT가 있다며 조절하며 마시리라 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굳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깨달은 나는 지나가던 선배일 지, 아니면 나처럼 시간을 착각한 신입생일 지 모르는 누군가를 붙잡고 물었다.
"혹시 지금 몇시에요?"
"9시 조금 넘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조금 안되게 일찍 도착하는게 말이될 리가 없다고, 분명 내가 붙잡은 사람이 내가 신입생임을 알아보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역시 대학교는 만만치 않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할 때쯤 깨달았다. 오는 길에 아직 올리브영이 열지 않았다는걸.
강의실 구석에 먼지 쌓인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고 5분정도 충전한 뒤 내 핸드폰은 내게 09:11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간을 보여줬다. OT는 11시였고 졸지에 '지각생'에서 시간약속을 '과하게' 지켜버린 부지런한 신입생이 되어버렸다.
'씨X...'
1시간 반 가량 전 내뱉은 욕을 다른 의미로 내뱉을 줄은 몰랐다.
30분정도 지났을까, 뒷문이 덜컥, 아니 달칵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다. 분명 OT를 준비하는 선배 중 한 명이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강의실을 들렀으리라 생각한 나는 첫 인사를 호기롭게 박기(?) 위해 당차게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
희다 못해 실핏줄이 약간 보이는 볼에 오밀조밀한 코, 염색끼가 약간 도는 뿌리는 검은 긴 갈색머리에 약간은 작지만 자기주장은 분명한 속 쌍꺼풀이 짙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약간은 당황, 아니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하는,
그래 그 때가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여기 컴퓨터공학과 신입생 OT하는 데 맞죠..?"
"네..근데 아직 10시도 안됐는데 왜.."
"..그쪽은 왜.."
"..."
말 없이 자리에 앉은 나는 무안함에 애꿎은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다. 다시 문이 달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심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생각보다 큰 키에 새까만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블루베리 향이 났다.
"안녕하세요 신입생이시죠?"
"아, 네.."
"어디사세요?"
대뜸 어디사냐고?
"저 일산.."
"저는 오금에서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버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이름이 궁금하지 않은지
"몇 살이에요?"
"스무살.."
"저도 스무살이에요! 말 놓을게요!"
아니 말을 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졸지에 이름도 모르는 2시간 거리가 넘게 사는 여자랑 친구를 먹었다.
"수시?정시?"
"네? 아니..응?"
"수시로 온거야 정시로 온거야?"
"나 수시.."
"나도 수시로 들어왔어!"
말 좀 끝까지 들어라 이 여자야.
"근데 왜이렇게 일찍 왔어?"
"시간을 잘못 알아서.."
"헐 나도!"
이 여자는 내 말의 끝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멱살 잡히듯 대화를 이끌려 다니던 나는 이번엔 선빵을 기가막히게 치고 나도 너의 말을 끊어주리라 다짐하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선
"너.."
"아 맞다 너는 이름이 뭐야?"
알파고를 상대하던 이세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한 수 한 수가 막혀 숨까지 턱턱 막힌다. 그때 덜컥하고 앞문이 열렸고 그제서야 나의 호기로운 인사를 신입생에게 빼앗긴 선배가 한 분 들어와 이 일방적인 대화의 흐름을 끊어주었다.
계속
(예전에 블로그에 쓰던 글인데 내일 일찍 출근이라 내일 덧붙이겠습니다)
댓글목록
지지님의 댓글

재밌네요 계속 연재해주세요! 문장이 제스타일이네여 좋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