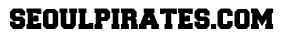라이타 독점계약
페이지 정보

본문
라이타 독점계약
-
때는 잠시 앉으면 모기가 달려드는
습한 여름날의 저녁이었다.
손을 저으면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은 습한 공기는
바닷속을 한조각 잘라서 가져온 것 같았다.
깜빡거리는 가로등불은 사실
저 깊은 심해를 잘라오다 딸려온 심해어라고
그런 감성 구라를 쳐도 대충 넘어갈 하루였다.
그런 날이 있지 않나.
술자리 친구들은 이런 여름 밤이면
담배를 피우자며 우르르 몰려나가
몇십분이고 돌아오지 않기 일쑤였다.
비흡연자인 나에게는 여름밤의 담배가
그렇게 크게 와 닿는 정취는 아니었으나
한가지 마다하지 않는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담뱃불을 붙여주는 일이었다.
미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면
나는 곧잘 따라나가 불을 붙여주곤 했다.
상대가 누구라도 굳이 상관은 없었으며,
딱히 연애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라이타의 노란 불빛에 잠시 밝혀졌다가
이내 사라지는 미인의 얼굴은
아주 잠시 태어났다 사라지는 우주였고
그만한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비흡연자인 나는 라이타가 없었으므로
미인들의 라이타를 빼앗아 불을 붙여주면서
내 것 처럼 아주 능청과 유세를 하곤 했다
그날은 큰따옴표, 그러니까 쿠오트-마크 모양의
작은 점이 있는 미인을 만났다.
문장부호가 얼굴에 있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건 무슨 말을 해도 인용문이겠군.
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확실치는 않다.
다만 짧은 대화 끝의 결론으로는
나는 너에게만 담뱃불을 붙여줄테니
너는 나에게만 담뱃불을 받아다오 라는 내용의,
이른바 "라이타 독점 계약" 이었다.
술김에 반 쯤은 장난으로 나눈 얘기였지만,
미인은 웃었고 나에게 자신의 라이타를 맡겼다.
지나간세계 라고 쓰여진 노란 색의 라이타였다.
거짓말같이 다음날부터 큰따옴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흔적도 연락도 아무것도 남은게 없으니
그건 꿈이었나, 잠깐 졸았던 걸까.
다만 유일한 증거인 라이타가 남아있다
불을 붙이지 못하는 날들이 시작됐다.
사실 그런 술자리의 장난스런 약속 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겠지만
왠지 이번에는 그러면 안될 것 같았다.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했으므로
독점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고
그 뒤로 몇 명의 미인을 만났지만
담뱃불은 붙여주지 못했다.
그들이 불을 붙여달라 물어본 건 아니었으니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청파동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지나간 세계라는 술집을 찾았기 때문이다.
간판은 없었고 하늘색 문에
지나간 세계라는 글씨만 적혀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뽀득뽀득 손으로 문질러 보았다.
술집은 아주 작아서 의자가 네 개 밖에 없었다.
나는 혼자 왔지만 합석한 꼴이 되었다.
노란색의 지나간세계 라이타를 꺼내 보인 나를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예전에 만들었던 라이타고 지금은 없다고 했다.
주인은 오랜만에 본다고 했고,
손님들은 처음 본다고 신기해 했다.
어디서 났냐는 질문에 나는 그냥요, 주웠어요 하고 답했다.
술집 주인은 오랜만에 보는 라이타가 반갑다며
지나간 세계라는 이름을 풀어주었다.
김금희라는 작가가 있고, 젊은 작가상을 받았으며,
그 소설에 나오는 술집 이름이라고.
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때는 소설에 나오는 이름인 줄도 몰랐다던가.
소설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어느덧
시인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술집 구석의 시집을 꺼내서 낭독하고 있다.
기차소리가 난다. 옆이 철길이었나,
이 곳에 있었을 큰따옴표를 떠올려본다.
어쩌면 모든게 인용문이었을지도 모르지.
"라이타 독점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한 편의 이야기에서 따온
단지 짧은 문장이었다고.
"지나간 세계"라는 술집의 이름이
정말 지나갔으며 정말 세계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한 편의 소설에서 가져온 것 처럼 말이다.
한편의 낭독이 끝나자 옆자리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러 가자고 보챘다.
나는 비흡연자였지만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 홀로 앉아 있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져온 그 라이타,
지금은 멸종된 노란 라이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저 한번 써볼래요 하고.
음, 이게,
설명하기엔 긴 이야기인데요,
고민하던 나는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했다.
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바람이 들지 않게 손을 오목하게 감싸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폐에 담배연기가 들어가는 건 싫었으므로
난 그냥 불을 붙인 담배를
향 처럼 물고만 있었다.
등을 기대고 침침한 골목길을 보았다.
그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