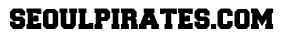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김금희 - 조중균의 세계 (10)
페이지 정보

본문
김금희 소설 (10)
7.
회식은 신촌 기찻길에서 있었다. 부장이 말했듯이 주먹고기 집에서였다. 오늘의 주인공이니 본부장 앞에 앉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고기를 구웠다. 본부장은 상상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좋았고 그래서 기분이 더 가라앉았다. 테이블에는 해란 씨도 없었고 조중균 씨도 없었다. 조중균 씨는 교정 기한을 한 달이나 넘겨서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 태만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었다. 소송이나 일인 시위를 벌일지도 모른다며 회사는 내게 경위서도 받았다. 경위서는 부장이 썼고 나는 거기에 사인만 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 수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말 그대로 ‘0’ 명이 되었다.
지난여름 동안 아무도 조중균 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서 조중균 씨가 사라지자 모두들 조중균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들 조중균 씨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모두가 기억하는 모두의 조중균 씨가 있었다. 서 대리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사르트르의 묘지를 찾아가곤 했는데 조중균 씨가 거기 죽치고 앉아 있던 ‘길 위의 방랑객’과 무섭도록 닮았다고 했다. 그는 늘 거기 앉아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작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왼손을 움직여 단어 하나를 반복해 쓰곤 했다는 것이다. “조중균 씨도 왼손잡이였잖아요.” 조중균 씨가 왼손잡이였던가? 기억해봤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도플갱어인가, 누군가 말했다. “손가락 마디가 두어 개 없었잖아.” 또 누군가 말했다. “아예 손가락 하나가 없었잖아.” “아니, 그냥 마디 두 개가 없었어요.” “3년간 뭘 봤어? 왼손 약지가 통째로 없었는데.” “그 수첩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내가 서 대리에게 물었다. “자유, 프랑스어로 리베르테!”
아무도 해란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있다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문제의 책이 출간되고 수습 기간도 끝나면서 나는 긴장이 놓였달까, 안심을 했달까, 아무튼 어딘가 한풀이 꺾여 있었다. 안착은 그렇게 허무의 포즈를 하고 왔다. 그래도 고기를 굽고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아줌마.”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나는 회식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홀에 앉았다. 더 앉아서 술을 받아먹다가는 완전히 취할 것 같았다. “왜 자리 못 찾겠어?” 식당 아줌마가 돌아봤다. “아니요, 주먹고기는 왜 주먹고기예요?” 아줌마는 양푼에다 부지런히 콩나물을 무치면서 내게 걸어왔다. 그리고 왼손 주먹을 눈앞에 대면서 “알지? 주먹?” 했다.
“알아요.”
“주먹을 닮아서 그런 거야.”
회식이 끝나고 부장과 나만 마지막 전철을 탔다. 부장은 취기가 올라오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영주 씨, 영주 씨는 무슨 힘으로 사나?” 무슨 힘, 사는 데 무슨 힘이 필요하나. 그냥 사는 거지, 생각하다가 주먹을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주먹이래요, 주먹.” 그사이 잠이 들었는지 부장이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다. “뭐가 주먹이야?” “주먹구구 아니래요, 주먹이래요.” “그래그래, 젊은 사람들 주먹 불끈 쥐고 기운 내야지, 힘내야지. 젊음의 주먹, 좋다.” 부장이 갑자기 박수를 쳤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좋을 대로 해석해주는구나. 이런 게 정규직의 힘인가, 생각하고는 나도 꾸벅꾸벅 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밤하늘에는 그믐달이 떠 있었다. 어느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지 누가 엉엉 울면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러니, 나한테 그러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 그 술집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다. 그 지나간 세계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봤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집이 라디오 방송국 뒤편을 돌아 몇 번째 골목에 있었는지 생각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공터에서 얼마를 걸어야 나오던 곳이던가를. 그리고 그 집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떠올리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뭐가 있었는가보다는 뭐가 없었는가가 더 세세히 떠올랐다. 거기에는 6인용 테이블이 없었다. 복수를 잊어버린 조중균 씨도 없고 빈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조중균 씨도 없었다. 나태한 조중균 씨도 없고 내 사인이 적힌 수첩도 다행히, 아주 다행히 없었다. 문장과 시와 드라마는 있지만 이름은 없는 세계, 내가 간신히 기억하는 한, 그것이 바로 조중균 씨의 세계였다.
(이상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66611.html
댓글목록
준준님의 댓글

끝날까봐 무서워서 마지막 부분에선 한글자 한글자 숨참으면서 읽었네.
진짜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