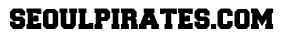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김금희 - 조중균의 세계 (9)
페이지 정보

본문
김금희 소설 (9)
조중균 씨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는 시험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점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름이 가까운 교정에서 다당다당다당 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조중균 씨 귀에는 왠지 그것이 나 가 나 가 나 가 하는 소리로 들렸다. 쿵쿵덕쿵덕 쿵쿵덕쿵덕 장구 소리가 들려왔다. 조중균 씨 귀에는 왠지 그것이 뻑뻑뻐꾸기 뻑뻑뻐꾸기라고 들려왔다.
“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중균 씨가 물었다.
“이름 적기가 시험이야, 이름만 적으면 돼.”
감독관이 조중균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름만 적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조중균 씨는 부끄러웠다. 여기에 이름을 적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교수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조중균 씨는 이름을 쓰지 않고 빈 종이에다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노크하듯 두드렸다.
“이 친구, 이름만 적으라니까.”
다시 빈 종이가 왔다.
“이 친구, 다른 문장을 적으면 안 돼. 이름만 적어, 이름만 적으면 점수 준다니까.”
또 빈 종이가 놓였다. 조중균 씨는 다시 볼펜을 잡았다.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이름만 적어, 중균아, 유급하면 군대 간다” 하고 말렸다. 하지만 조중균 씨는 문장을 끝까지 적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름은 적지 않았다.
“그렇게 멋있는 놈이야, 얘가. 아주 난놈이야. 와, 끝까지 이름을 안 적는 놈이야.”
형수 씨는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흥분이 되는지 그런 놈이야, 놈이야, 하면서 조중균 씨를 껴안았다. 손목이 아주 이상한 각도로 꺾여서 나는 그제야 형수 씨가 의수를 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뭘 적었는데요?”
“시였습니다.”
조중균 씨는 맥주잔을 들었다 놓으면서 아주 잠깐 웃었다. 마치 꽃이 지듯 조그마한 입술이 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란 씨가 물었다. “망했지, 유급했지, 군대 갔지, 사고 났지.” 형수 씨는 아까 드라마 줄거리를 말할 때처럼 좀 새침하게 대답했다. “이름 덕분에 살기도 했다면서요?” 내가 묻자 “아, 성공!” 하며 형수 씨가 모기 채로 찰싹 벽을 때렸다.
그때 그 시험장에서 쓴 시 제목은 ‘지나간 세계’였다. 형수 씨 말로는 그 당시 어떤 시보다도 더 자주 집회에서, 연설장에서, 학회실에서, 엠티에서 낭송됐다고 했다. 그런 ‘전단시’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데모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조중균 씨의 ‘지나간 세계’야말로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잘해주었다는 것이다.
“아, 그래서 조중균 씨가 유명해졌구나.”
전철 끊길 시간이 되어서 나는 얼른 결론을 냈다.
“아닙니다.”
조중균 씨가 불콰해진 얼굴로 나를 건너보았다. 노가리 채가 입술 사이에 붙어서 떨어질락 말락 했다. 조중균 씨는 그 시는 자기가 썼지만 자기 시는 아니라고 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기 이름을 붙여 자기가 쓴 것처럼 연단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낭송할 수 있었으니까.
“나도 읽었어. 격해지면 막 울면서 읽고 취해서 읽고 좋아서 읽고, 아직 내가 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을걸?” 형수 씨가 말했다. “나쁘다. 그러면 도용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툭 던지자 형수 씨는 흥분했다. “얘 좀 봐라,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 중균아, 얘들이 모른다, 우리 세계를 몰라.” “우리도 알아요.” 해란 씨가 발끈하며 말했다. “알긴 뭘 알아? 니들은 모른다, 몰라.” “해란 씨는 압니까?” 조중균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딘가 좀 젖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알아요. 안다니까요.” 하지만 형수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너네 이제 집에 가라. 우리 자야 하니까” 했다.
뭐야? 그러면 조중균 씨와 형수 씨가 여기서 사는 거였나? 가게 안을 둘러봤다. 창고인지 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문이 하나 있긴 했다. 나는 해란 씨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중균 씨는 술에 취했는지 어쨌는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갈게요.”
정말 화가 났는지 형수 씨는 답이 없었다. 저렇게 기분이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과 웬만해선 표정 변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택시를 타고 해란 씨를 집에다 내려주었다. 해란 씨는 뭔지 모르겠는데 참 슬프다고 훌쩍거렸다.
“알바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
“집에선 안 그랬는데 서울 올라오면서 완전 울보 됐어요.”
“집이 어디랬지?”
“옥천이요. 어, 처음이다.”
“뭐가 처음이야?”
“언니가 저한테 그런 거 묻는 거요.”
“그런 거 뭐?”
“개인적인 거요.”
나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근데 아까 안다고 했잖아? 해란 씨, 뭘 안다는 거였어?”
“안다고요? 아, 그때…… 뭔지는 몰라도 알 것 같기는 했어요.”
“뭘?”
“아무튼, 그분들 세계를요.”
택시에서 내린 해란 씨가 목발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해란 씨는 좀 가다가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꽃 한 송이, 고양이 한 마리 없는데 뭘 찍나. 나는 그 어두운 편을 같이 바라보다가 “가요, 아저씨” 하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66403.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