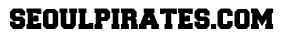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김금희 - 조중균의 세계 (3)
페이지 정보

본문
김금희 소설(3)
2.
5주쯤 지나자 해란 씨와 나에게도 업무가 떨어졌다. 개정판 작업이었다. 어느 노 교수의 오래된 저작이었는데 교재로 쓰겠다고 500부만 작업하는 것이었다. 부장은 조중균 씨를 잘 달래서 저자 뜻대로 개강 시한에 맞춰 책을 내라고 말했다.
“그 친구 원래는 편집자로 채용됐는데, 난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경력이 이쯤인데 이 정도면 값싸다고 회사에서 들였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왜 뽑아, 고기로 치면 다 죽게 생긴 노계 같은 사람을.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나? 노계가 질기긴 또 얼마나 질기나? 고집이 세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아차 싶어 자르자니 좀 있으면 쉰 되는 사람을 어디로 내쳐? 내가 교정직으로 옮기자 했지.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옜다 너 처박혀서 그거나 해라, 했더니 좋아해.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해. 3년을 있어도 조중균 씨는 융화가 안 돼. 문제가 많거든,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거든.”
그렇게 해서 셋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해란 씨와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첫 실무였고 아마 이 작업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테니까. 부장은 해란 씨가 첫 교정지를 보고, 조중균 씨가 그다음 교정지를, 나는 최종 확인만 하라고 지시했다. 해란 씨가 교정 보는 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조중균 씨에게 교정지가 넘어가던 날, 드디어 조중균 씨와 대면했다. 왠지 긴장됐다. 조중균 씨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떨리나. 하긴 아예 모르는 사람과 가는 것보다 좀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더 어색하고 긴장되니까. 작업 방향을 설명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하자고 하자 조중균 씨가 안 된다고 했다.
“왜요? 점심 원래 안 드세요?”
“네.”
아, 그렇구나, 자발적으로 점심을 안 먹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따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도 예의상 지켜지는 룰이 있는데. 사람 밥도 못 먹게 은근히 따돌리는 것, 그렇게 코드와 선택을 드러내는 것이 더 피곤한 일 아닌가.
“점심 안 먹는 게 몸 가볍긴 해요. 건강 챙기시는구나.”
“아닙니다. 먹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때 거울이 있다면 내 표정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
“왜요? 왜 먹고 싶은데 참아요?”
“식대, 아끼려고 그럽니다.”
“무슨 식대를 아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고 무료잖아요.”
“무료 아닙니다. 안 먹는다고 하면 돌려줍니다. 9만, 6,000원.”
조중균 씨는 말 중간에 쉼표를 넣어 이상하게 끄는 버릇이 있었다. 그나저나 연봉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를 무슨 수로 받아냈다는 말인가?
“9만 6,000원이면 크다.”
옆에서 해란 씨가 관심을 보였다. 조중균 씨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이마에서 구레나룻까지, 인중과 목까지 마치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하듯. 그리고 당연한 수순처럼 휴대전화가 울렸고 조중균 씨가 전화를 받아 “형수야, 잠깐만” 하고 끊었다. 야야, 나 배고프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 나왔다. 형수는 친구 이름이구나, 하기는 자기 형수님이랑 저렇게 자주 통화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점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식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수습이라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건가?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 필요하지만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65166.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