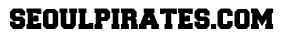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은선 - 심도
페이지 정보

본문
심도 / 銀線
카메라를 들고 K가 묻는다. 오빠, 심도하고 삶이 무슨 상관일까?
얘는 또 무슨 헛소리지. 창고의 낡은 짐을 정리하다 보면 으레 그렇게 되듯이, 추억의 물건들을 뒤적거리던 참이었다. K가 들고 있는 건 낡고 먼지가 쌓인 카메라였다. 어릴적 사진작가가 되겠다며 설치던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있던 걸 졸라서 얻어낸 것이다. 정확히 내가 중2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도 이젠 안계시고, 카메라를 잊고 산지는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검은색의 바디가 회색이 될 정도로 먼지가 쌓인 그 카메라는 K가 입고 있는 쨍한 녹색의 스웨터와 대비되어 한층 더 희미해 보였다. 온 세상이 알록달록하니 채도가 높은 가운데, 혼자서만 흑백사진이 된 것만 같았다. 나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그 부분만 지우개로 지운 것 처럼 보였다. 질 안좋은 지우개로 지우는 바람에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좌우로 흐려지기만 한 그림 같았다.
심도가 왜?
여기, 적혀있어. '심도 깊은 삶을 거부한다'.
세상에나. 어린 내가 카메라에 붙여둔 것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껏 적어서 스카치테이프로 코팅하듯 붙여둔 것이다. 그 진지한 문장에 민망했다. 싸이월드 다이어리를 들킨 것 보다 곱절은 더 부끄러웠다. K는 내가 민망한게 재밌는지 자꾸 캐묻는다. 왜 심도야? 그러게. 왜 심도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이건 아마도 '피사계 심도'를 말하는 거다.
예를 들면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고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는 사진들 말이다. -아웃 포커싱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초점이 맞는 영역이 얕으니 사람은 선명하고, 멀리 있는 배경은 흐려진 것이다. 그걸 심도가 얕다고 한다. 심도가 깊으면 사람도 선명하고 배경도 선명하게 나오겠지. 심도가 아주 깊으면 저 멀리까지 뚜렷하게 잘 보일 것이다. 모든게 다 선명하게.
카메라에 붙은 이 증거에 의하면, 그 때의 나는 심도 깊은 삶을 거부했다. 중2때 어떠한 마음으로 적어 넣은 이 문구를 이제 나는 부끄러워 하는 어른이 되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가 처음 사진작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 하자면 히로스에 료코였다.
그 때는 '니뽄삘'이 유행이었다. 조금 논다 싶은 형 누나들이 니뽄삘이라며 한껏 꾸미고 하두리캠으로 찍은 셀카를 올렸다. 나도 꽤나 멋 부리기를 좋아하는 중학생이었으므로 잘 나가는 패션의 정보를 찾아 이리 저리 쏘다녔다. 을지로에 가면 외국 잡지를 파는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 패션잡지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동대문의 니뽄삘과 일본 시부야의 그 것은 어느 하나 일치하는 곳이 없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일본 잡지에서 활짝 웃는 소녀의 화보를 보게 된 것이고, 가느다란 선이 인상적인 그 배우가 바로 히로스에 료코였다. 나는 그 사진이 뒷자리 아무개와 참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눈이 크고 날씬한 아이였다.
얼마 뒤 할아버지댁에 방문하게 된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를 보고 잡지의 그 사진이 생각났다. 할아버지, 나 사진이 찍고 싶어요. 글쎄요, 찍고 싶은게 있나봐요. 그렇게 얻어온 카메라였다.
-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삶은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며 보기 싫은 것들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훌륭하게 아웃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이것 저것을 찍어보면서 나름 진지하게 사진 공부를 했고, 그때 알게 된 몇 가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저 '심도'였다. 보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나에겐 아주 매력적이었다.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배경은 흐릿하게 사라졌다. 내가 심도가 얕은 사진을 좋아했던 이유는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회화적이었기 때문이다. 배경이 흐릿해지면 못생긴 동네 골목길이 반짝반짝하는 하라주쿠의 번화가처럼 보였다.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잊게 해주었다.
K는 궁금하다고 했다. 지금은 사진작가가 아니라도 그때 찍은 사진은 남기 마련 아니냐며.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 사진도 여기 있을 것 아니냐며. 그 때 찍은 사진이 보고싶다고 했다. 아니, 사진은 없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다. 코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심도가 깊어서 저 멀리까지 선명히 나온 사진처럼 말이다.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은 아름다웠지만, 그 배경에 선명하게 미래를 그려 넣은 현실은 신문의 보도사진처럼 딱딱한 풍경이 되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즈음 나는 서서히 철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알고는 있었다. 내가 사진작가를 할 형편은 못된다는 것을. 다만 잠시만이라도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나는 사진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통해 앞날을 흐릿하게 무시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마지막 철 없음을 쥐어 짜내어 '심도 깊은 삶을 거부'한다고 카메라에 붙였다. 플랭카드처럼 붙여둔 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학년이 올라가며 반이 바뀌기 전에, 나는 생에 처음으로 인물 모델을 섭외한다. 뒷자리 아무개 말이다. 저기, 사진 찍어줄까? 그 애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24컷짜리 후지필름을 카메라에 넣고 학교수업이 끝난 후 찍기로 했다. 해질녘의 노란 햇빛이 학교 복도를 저 끝까지 비추고 있었다. 그 애의 눈동자가 아주 연한 갈색이란 것도 그 때 알았고, 잘 안보이는 아주 작은 점이 눈 밑에 있더란 것도 처음 알았다. 찰칵 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주말은 결과적으로 영 엉망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문을 텄지만 그 외에는 딱히 접점이 없었다. 불러본 적이 몇 번 없어서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마주본 적이 몇 번 없어서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아무리 이뻐한다 해도, 그게 우리가 잘 될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혼자서 강가를 걷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
-
그 날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것에 격분한 아버지는 내 모든 사진과 필름을 불태웠다.
부모에 의해 자식의 꿈이 부서지는 경우 -예를 들면 기타가 부서지거나, 캔버스가 찢어지거나, 노트가 북북 찢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식은 반항하면서 뛰쳐나가거나, 울면서 뜯어 말리거나, 침통하게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게 제대로 된 진행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못난 나는 마음이 너무 편했다. 일렁일렁 필름이 타는 노란 불빛이 그때의 그 노란 햇빛 같았다.
K는 너무하다고 했다. 사진이 아깝다고도 했다. 뭐, 이제는 굳이 미련은 없다. 그 뒤로 카메라는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으니까. 이후에는 공부만 했고, 지금 꽤나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된 것에 나름 만족하고 있다. K는 처음 보는 옛날 카메라가 신기한지 이리 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어쩔까, 창고를 정리하는 김에 팔아버릴까. 요즘 필름카메라는 골동품에도 안 껴준다던데. 당근마켓에 얼마에 올릴지를 고민중이었다.
갑자기 앗! 하고 K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게 꼭 셔터소리처럼 들렸다. 아니면 번쩍 하고 터지는 플래쉬 같았다. 뭐야, 또 망가뜨렸구나, 하는 내 말에는 대답도 없이 K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봐, 하며 카메라를 내게 주었다. 거기엔 필름이 들어 있었다. 24컷이 찍힌 후지필름이, 얌전히 감긴 채로.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