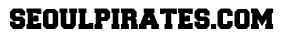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김금희 - 조중균의 세계 (8)
페이지 정보

본문
김금희 소설 (8)
6.
그리고 그날 저녁 해란 씨가 회식을 하자고 했다. 셋이서. 해란 씨 친구가 한다는 카레 집에서 카레를 먹고 어색하게 맥주를 마셨다. 조중균 씨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자기 세계로 가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나마 해란 씨가 자꾸 말을 시켜서 그의 관심을 카레 집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다. 해란 씨는 조중균 씨에게 2만 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2만 원? 조중균 씨가 머뭇거리자 해란 씨는 “영주 언니는 모르잖아요,” 하고 졸랐다. 조중균 씨는 맥주를 한 병 더 주문하면서 셔츠 앞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다. 아까 오후에도 긴장 속에서 확인했듯이 2만 원이었다.
학생 때 조중균 씨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다 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형사가 목욕이나 하고 들어가라면서 5,000원을 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다는 것이다. 조중균 씨는 그게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목욕하고 들어가란다고 모욕을 느끼다니. 아무튼 그 뒤로 조중균 씨는 셔츠 주머니에 늘 2만 원을 가지고 다녔다. 그때 그 형사와 마주치면 이자까지 해서 갚을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니까 2만 원은 모욕을 되갚겠다는, 복수를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증표였다.
“형사 얼굴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거짓말 같은데.”
“정말 기억합니다.”
아무렴 그러시겠지. 해란 씨는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며 용기를 주었지만 나는 그런 사소한 복수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한 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고 나오는데 조중균 씨가 한잔 더 하겠느냐고 물었다. 한잔 더, 라니? 조중균 씨가 우리를 데리고 비보이 극장과 유명 연예인이 한다는 실내 포장마차와 라디오 방송국을 지났다.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좋다고 해란 씨가 목발을 짚으면서 말했다. 정말 회사원이 된 것 같아요, 회식을 다 하고.
조중균 씨가 들어간 집은 철제로 된 미닫이문이 달려 있는 술집인지, 그냥 개인 공간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문에는 파란색 코팅지가 붙어 있고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지나간 세계, 라고 쓰여 있었다. 해란 씨가 그 글자를 만지면서 “언니, 봐요” 했다. 조중균 씨가 매일 적고 매일 퇴고한다던 시의 제목이었다. 가게에서는 파마머리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우리를 맞았다. 테이블은 하나밖에 없었고 의자도 세 개뿐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딱 맞게 왔네요, 했더니 조중균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세 명이 아니면 데려오지 않지요, 했다.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는 가게 주인이 주로 떠들었다. 주인은 자기를 형수 씨라고 부르라고 했다. 아, 이 사람이 형수구나. 형수가 이름인가 했더니 한때 사형수였다고 했다. 농담인가 진짜인가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킬킬 웃었다.
대화의 주제는 주로 형수 씨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였다. 아침 드라마에서 종편 드라마까지 형수 씨가 챙겨 보는 드라마는 스물두 편이나 됐다. 형수 씨는 드라마는 스물두 편인데 스토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서 나중에는 형란이랑 바람피운 놈이 재수인지, 영희인지, 영옥이를 괴롭힌 사람이 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내연녀인지, 이복동생인지, 지금 쟤가 쟤 딸이 맞는지, 아니면 재가 쟤 딸이 아니라 사실은 쟤 딸이었는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래 봤자 쟤가 쟤랑 합법적으로 자려고(결혼은 그런 거라고 했다) 쟤는 쟤 돈을 합법적으로 쓰려고(결혼은 또 그런 거라고 했다) 쟤는 쟤 돈을 쟤가 쓰는 게 싫으니까(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다고 했다) 쟤가 쟤를 시켜서 훼방을 놓는 거(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했다)라고 했다.
자꾸 마셔서 그런지 나는 서서히 이 키치적인 술집에 적응해 들어갔다. 테이블에 놓인 김치찌개처럼 자글자글 끓는 분노랄까, 히스테리랄까, 하는 것이 은근히 느껴졌다. “그렇게 냉소하면서 왜 봐요. 고상하게 예술영화나 볼 것이지.” 내가 말하자 형수 씨가 “그 재밌는 걸 왜 안 봐? 그래도 거기에는 드라마가 있잖아” 했다.
조중균 씨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거나 복기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형수 씨가 맥주를 꺼내오더니 조중균 씨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조중균 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서 8만 원쯤을 꺼내주었다. 화제는 각자의 이름 이야기로 넘어갔다. 해란 씨 이름은 실향민인 할아버지가 해란강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했다. 내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없었고 조중균 씨 사연은 형수 씨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얘가 이름 때문에 망하고 이름 때문에 산 애야. 그야말로 드라마가 있단 말이야.”
저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에게 드라마가 있다니. 형수 씨는 노가리를 구워서 올려놓더니 “내 한번 얘기해줘요?” 했다. 정작 조중균 씨 이야기인데도 조중균 씨는 말이 없고 형수 씨만 무성영화의 변사처럼 신이 나 있었다.
형수 씨와 조중균 씨는 같은 대학에 다녔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없는 역사 교수가 하나 있었다고 했다. 수업 시간의 반 이상을 야당과 ‘데모대’ 욕하는 데 쓰는, 청년들과는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교수였다. 필수라서 신청은 했는데 수업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문제는 유급은 하고 싶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유급은 정말 안 된다. 가난하고 군대도 가기 싫은데 유급하면 돈 날리고 군대도 가야 하니까. 그런데 마침 시험에 응시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그런가, 의심하면서도 모두들 우르르 시험을 보러 갔다. 개중에는 무슨 과목 시험인지도 모르고 휩쓸려갔다가 자기가 신청한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애석해하며 돌아간 친구도 있었다고 했다.
강의실로 들어가자 감독관이 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소문대로 칠판에는 시험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름만 적으라고 감독관이 말했다. 단,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먼저 나갈 수 없었다. 이름을 적고 나니 시간은 그대로 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잤고 누군가는 무료하게 볼펜을 돌렸고 누구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시험지 귀퉁이를 찢어 껌처럼 씹었다. 그리고 여기 빈 종이 앞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조중균 씨가 있었다. 왜 문제가 없지, 하고.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66201.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