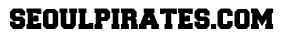[단편소설] 김금희 - 조중균의 세계 (4)
페이지 정보

본문
김금희 소설 (4)
조중균 씨는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처음이라 절차를 만들기까지 좀 혼란이 있기는 했다고 했다. 대리에게 말하자 과장에게로 올라갔고 부장에게로, 최종적으로는 본부장에게로 넘겨졌다고 했다. 그렇게 8개월 만에 조중균 씨는 점심을 먹지 않을 권리와 식대를 돌려받을 권리를 의논하기 위해 본부장에게로 불려갔다. 본부장은 조중균 씨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중균 씨의 뜻은 존중하지만 선례가 없고 절차가 없어서 말이야, 하고 타일렀다.
“자네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냔 말이지. 우리 회사 직원은 인쇄소까지 삼백 명이 넘네. 자네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회사에 분란 일으키고 회사 게시판에 글들을 올리는 것 자체, 고작 점심 값 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우리 본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얼굴을 깎는 일이야. 그래도 나는 묻겠네.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네가 정말 구내식당에서 밥 먹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배도 고프고 나가서 먹기도 귀찮을 때 생쥐처럼 몰래 들어와 한쪽 구석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만약 삼백 명 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말이야.”
본부장도 조중균 씨 못지않게 괴팍한 성미인 모양이었다. 그런 걸 일일이 대응해주고 앉았다니. 하지만 해란 씨는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흥분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중균 씨는 본부장 말이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말 그렇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지요.”
조중균 씨가 셔츠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 껴 있던 만 원짜리 몇 장이 같이 떨어졌고 조중균 씨는 지폐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수첩에는 파란 볼펜으로 가로 세 칸, 세로 세 칸이 그려져 있었다. 날짜가 있고 그 옆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마지막 칸은 확인자가 서명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조중균 씨는 점심시간에 식판 대신 그 수첩과 볼펜을 들고 정수기 옆에 서서, 본부장이 식사하러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첫날에는 본부장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조중균 씨를 내내 지켜본 식당 아줌마에게 사인을 받았다. 2012년 11월의 첫 칸,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 옆에 최대한 성의 있게 쓴 “김애자”라는 사인이 보였다.
둘째 날에는 본부장이 식당으로 내려왔고 조중균 씨가 다가가 수첩을 내밀었다. ‘김애자’라는 이름 밑에 휘갈겨 쓴 “姜”이라는 사인이 보였다. 조중균 씨는 사인을 받은 뒤에도 올라가지 않고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선 채 자신이 정말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본부장이 사인을 하면서 “사인하고 나 나가면 그때 밥 먹는 건 아니겠지?”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12시 50분이 되면 조중균 씨의 것을 제외한 이백구십구 개가량의 식판과 오백구십팔 개가량의 젓가락들이 대형 세척기에서 돌아가고 식당 아줌마들이 청소를 시작했다. 아줌마들은 배고플 텐데 누룽지 끓인 거라도 좀 줄까? 매번 물었다. 물론 조중균 씨는 사양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야? 우리가 먹으려고 끓이는 건데 우리가 주니까 우리 몫에서 주니까 우리 것이지.”
해란 씨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중균 씨가 가엾다기보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과 무려 한 달간 씨름한 본부장에게 더 경악했다. 보아하니 교정직으로 밀려난 게 그때부터인 모양이었다. 본부장도 이런 직원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姜’이라는 사인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 대신 ‘김애자’, ‘오말숙’, ‘명말자’ 같은 이름들이 수첩을 채우더니 마침내 12월이 되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수첩은 빈칸으로 남게 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65345.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